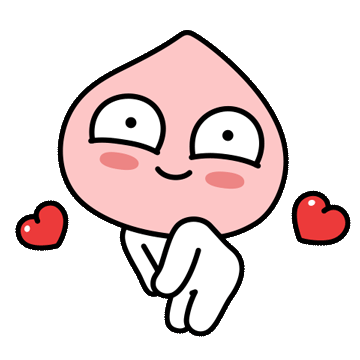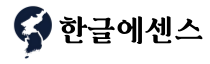상세 컨텐츠
본문

안녕하세요?
한글에센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세 국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두자음군에 대해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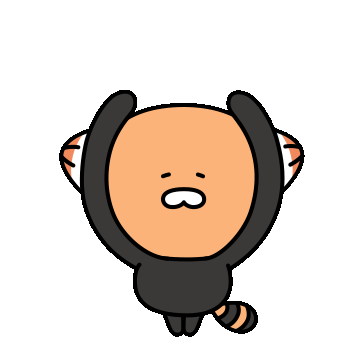
어두자음군의 의미를
풀이해 보자면
'어두'는 말의 첫머리인 초성을 말하고,
'자음군'은 자음의 무리라고 할 수 있죠.
즉, 초성에 자음의 무리가 올 수 있었다는 말인데요?
다른 자음을 ㅳ,ㅄ,ㅶ,ㅺ,ㅼ, ㅼ 등과 같이 나란히 쓰는 것을
'합용병서'라고
이 합용병서가 초성에 나오는 것을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릅니다.
앞선 글에서 잠시 설명했듯,
훈민정음 당대에는 음소적 표기를 사용했기에
어두자음군이 사용된 문헌 등을 통해
중세 때는 어두자음군이 있었고, 음가를 그대로 사용했을 것을 유추할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두자음군은
발음하기 힘들어지고,
오늘날의 된소리로 바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온 부분이죠?
'제ᄠᅳ〮들〮'
현대 국어로 풀이하면
'제 뜻을'이 됩니다.
어두에 왔던
ㅳ이 현대에 와서는 ㄸ으로 전환된 모습,
어두자음군이 현대국어에서 된소리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한글의 표기가 달라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시간인 듯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글에센스였습니다.